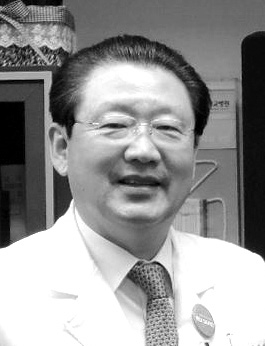소프트웨어(SW) 통계포털은 SW생산, SW수출, SW인력, 신SW산업 분야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브리프
SPRi가 만난 사람 –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헬스커넥트 대표
- 공영일 역대연구원
날짜2021.08.23
조회수12209
-
-
-
“의료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쟁 이미 시작돼…”
“요소 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의료정보시스템 표준화 시급”- 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마크 안드레센은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고 설파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안드레센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자동차, 금융, 유통, 조선, 항공, 출판, 의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SW로 인한 파괴적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 특히, 의료부문은 SW와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진료와 치료법에 신기술 도입,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SW가 바꿔가는 의료 현장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 의사이면서 의료정보 시스템 업체 ‘이지케어텍’에 이어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헬스커넥트’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이기도 한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찾아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 그는 최근 중동에서 의료 IT 한류바람을 일으키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 이지케어텍을 통해 의료 분야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보호
- 우리나라에는 의료 IT 전문 회사가 없었다. 내가 2004년 서울대학교병원의 자회사인 의료정보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삼성 SDS, LG CNS 같은 대기업은 병원을 상대로 한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었다. 임금과 단가가 낮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사업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 이지케어텍은 병원 자체 예산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발생하는 기본 매출을 기반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지케어텍은 의료 분야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풀의 명맥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병원(MNG-HA)과 아랍 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프로젝트 때 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우리가 이른 시일 안에 시스템을 구현하여 약속 날짜에 보여주니까 놀라워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1,500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10개의 오류가 났다. 이 중 8개는 상대편의추가적 요청으로 인해 일어난 오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단 2개의 오류만 발생한 것이었다. 참고로 미국 회사의 솔루션은 전체 500개 중 300개가 오류가 났었다.
-
- ■ 상상만 했던 N-device 환경을 의료 현장에서 구현
- ‘헬스커넥트’는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와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병원솔루션을 개발하였다. 특히 개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인점이 강점이다. 또한, 빅데이터 연구 기능도 있다.
-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에 접근성을 향상하는 ‘모바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55인치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병원 종합상황판 ‘대시보드’, 기존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태블릿 PC 기반의 ‘전자동의서’,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 설명처방’, 병원의 낯선 프로세스와 복잡한 구조를 안내하는 ‘SmartPatient Guide’ 등이 있다.
- 위의 사례들은 단지 헬스케어 영역에서 I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시범 적용이 아닌, 누구나 상상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N-device 환경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의사와 환자 모두 좋아한다. 모바일 EMR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정보 교환 건수가 174,768건에 달할 만큼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대시보드는 서비스 시작 후 월간 총 190,522건의 조회 기록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사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자동의서를 통해서는 한 달간 평균 9,135건의 동의서 업무, 연간 약 42만 장의 종이, 출력에 필요한 카트리지 연간 70개, 스캐너 유지보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었다.
- 정보통신기술(ICT)이 유통, 제조,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 소프트웨어가 국가적으로는 재정 절약, 소비자에겐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진료 형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제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만 저항이 생기고 있다.
- IT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에게 제일 좋은 일이고, 따라서 난 이걸 의료 주권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다. 헬스커넥트의 주요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겨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
- ■ 데이터 전쟁의 시작... 의료 식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 선도국이 될 것인가
- IT를 융합한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 의료 기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도 작은 입자로 엑스레이와 피검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나노 의학,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질병이 생길 것인지를 예측하는 유전체 의학 등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여 85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경험이 있다.
- 특히 유전체 의학 분야에 있어 하루빨리 국내에서 유전체를 검사하는 업체가 나와야 한다. 특정 유전체의 보유 여부에 따라 같은 약도 사람마다 복용 효과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이 데이터가 앞으로 돈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체 정보를 미국 업체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정보 밖에 갖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지금 데이터 전쟁이 시작된 거다. Google, GE, Apple 등의 회사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정보가 다 전송된다면 의료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려면 국민의 유전체 정보를 넘긴 후 데이터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질병은 환자의 환경 요인과 유전체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생긴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 정보(LifeLog Data)와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질병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어 맞춤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전체 정보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 나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도권을 잡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
- ■ 소프트웨어 정책 조언
- 합이라는 건 현재 개발된 분야를 합치는 것을 말한다. 원천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지원이 원천기술 개발에 편중된 상황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종 생산품 개발에 좀 더 정책적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국내외 업체들이 모여 최종 생산물(End Product) 개발에 매달리면 2~3년 이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무엇을 만들지를 정해놓고, 요소 기술을 융합하여 빨리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회사/병원/연구소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모바일 헬스 솔루션 분야 같은 경우에도 최종 생산물 개발 위주의 R&D에 집중하면 2년 이내에 10가지 이상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 표준화 이슈도 있다. 현재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마다 호환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의학용어, 의학 정보 교환 등 국제 표준을 지킴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에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었다. 한·중·일 국가에서는 일부만 표준을 지키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표준을 지키도록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표준을 지킬 때 유인책을 지원하거나 표준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곳을 인증해주고 공공병원 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EMR 시스템을 확산시킬 때 썼던 방법이기도 하다.
-
- ■ ■ ■
- 서울대학교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대표.
- 그는 의사도 반드시 경영 철학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얼핏 듣기에는 의사와 경영자의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그는 왜 ‘경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을까.
- 그는 “경영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것이다. 각 부서의 교수, 레지던트, 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원장이 된 후에야 비로소 경영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 이전부터, 내 욕심으로는 교수가 되는 순간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그는 평소에도 교수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리더십 강의를 직접 챙긴다고 했다.
- 후속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공을 들이는 그의 눈길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의료부문의‘혁신’과 ‘대응’에 닿아있는 듯 했다.
-
- 인터뷰 : 안경은 객원기자, 공영일 선임연구원